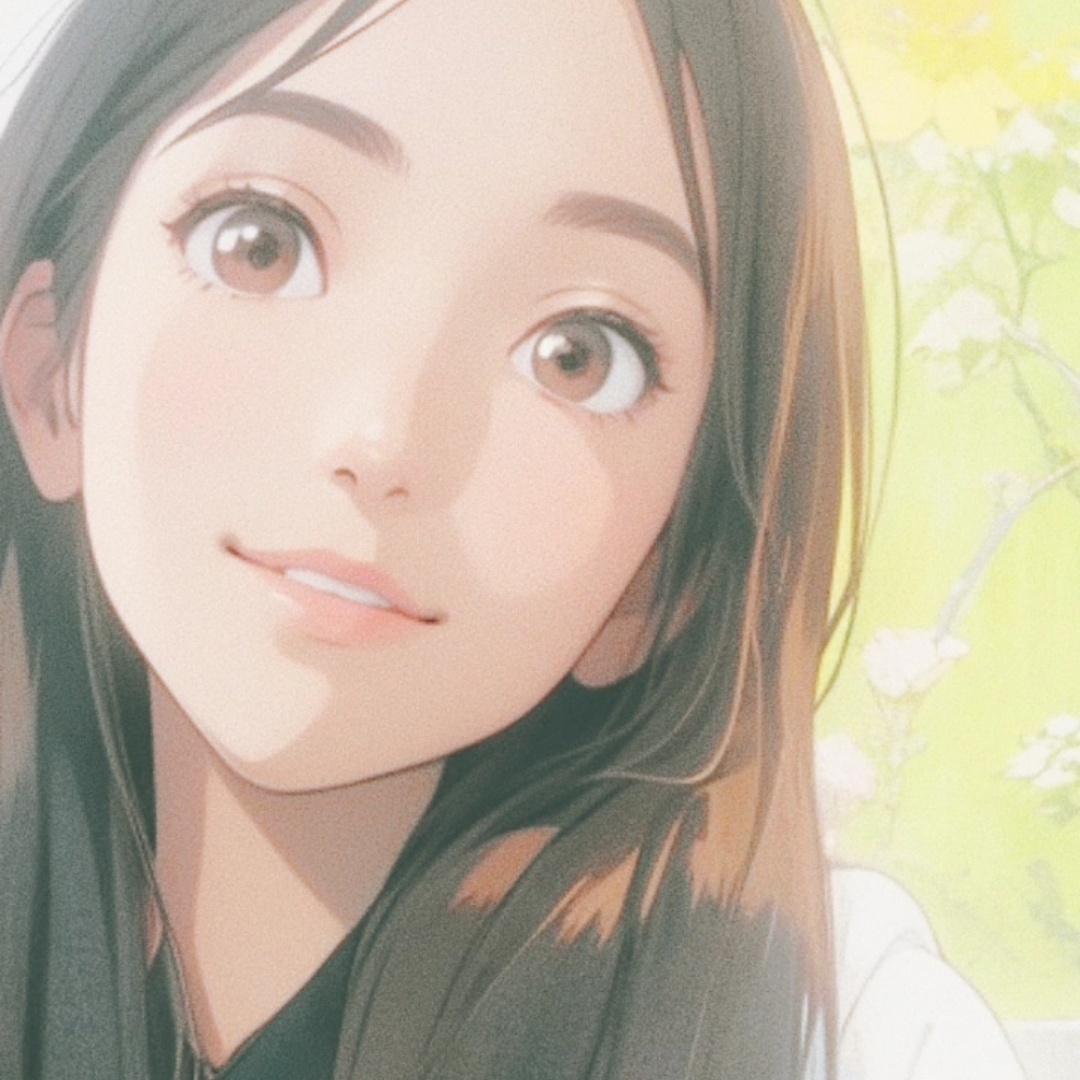글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상하게 이 블로그는 <브런치 스토리>의 번외편 같아지는 기분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서. 여기에서 나도 복기를 겸해서 몇 가지를 써볼까 한다.
처음 이 글을 쓰기로 했을 때가 2019년이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는데, 처음으로 신춘문예에 도전해봐야하나 고민을 했던 때이기도 하다. 소설도 아닌 글을 소설이라고 몇 편 쓰다보니 오기가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글로 담아내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써보자고 생각하니 문득 오랜 가수가 생각났다.
그러고 나니 다음으로 연상되는 것은 카메라 렌즈였다. 물방울 렌즈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고, 또 물방울 렌즈로 찍은 피사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어서 결과물을 글에 담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까다로웠다. 포토샵 세대라고는 하지만 나는 포토샵보다는 팬픽을 많이 썼고,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 쪽과는 멀어졌다. 그래서 포토샵 다루는 방법을 클래스 101에서 따로 들었다. 인물 보정하는 방법, 인물 사진 찍는 방법도 그때 다 들어두었다. (겸사겸사 타로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클래스 101의 강사들은 친절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준다.
그렇게 큰 틀을 담아냈다. 카메라가 있고, 사진사이고, 찍고 싶은 대상이 있고, 그런데 찍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는 실력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하지만 더는 애정을 담아서 애정만으로는 찍지 못하는. 자아도취가 되어서 'A를 찍는 나'를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내용을 큰 골조로 잡았다.
그러고 갈등 인물로 누구를 넣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
친구를 만나 듣게 된 이야기가 생각났다.
사진사인 친구는 고객의 까다로운 보정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인물을 재창조한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였다. 어떤 기분인지는 알 것 같았다. 당장 카메라 보정 어플을 써서 사진을 찍어도 느낄 수 있는 거였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친구의 이 고객을 진상 고객으로 삼기로 했다. (실제로 진상인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야기가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내 글의 분위기는 대체로 땅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계속 기분이 나쁜 투로 대화를 나누는 남녀의 구도를 짰다. 그랬더니 A와 진상 고객의 접점이 사라졌다.
나는 내가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을 마음에 고이 놔두고, 생각을 한차례 접었다. 그리고 글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A와 고객을 대등하게 두니 이것만큼 갈등 구도가 명확해지는 것이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구도를 그렇게 짜고 나니, 서술자인 '나'가 할 일이 확연히 줄어버린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사라지고나니 3인칭으로 쓰는게 낫겟다 싶었다.
그렇게 해서 A와 남자의 이야기, 3인칭의 글이 탄생했다. 처음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내 글도 아닌 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여러 버전의 '빛 번짐'을 두고 드라이브에 가둬버렸다. 그렇게 잊고 있었다. 이번에 낼 공모전에는 생각도 안했다. 차라리 새로운 것을 쓰는게 낫거나, 아니면 중장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내심, 공들인 원래의 버전1이 아까워서 어쩔까 생각을 이따금씩 했다.
싱어게인3을 보고, 버블을 받은 어느 새벽에 그냥 눈이 떠졌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다. 그 '홍이삭'에게 이 글을 맞춰주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서 급하게 한글 파일을 열었다. 버전1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뺐다. 다시 보니 징징거리는 것들도 있고, 말도 안되는 주접들도 있었다. (공모전에 떨어질 만은 했다) 글을 고치고 나니, 조금은 안정적이었다.
글이 오롯하게 주인을 맞게 되었다.
사람들은 글보다는 그림에 더 격한 반응을 보인다. 공카(공식카페)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 예전이나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요즘은 잘 읽지 않는다. 그래도 그 글의 새로운 주인이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두었다. 실제로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읽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이미 글을 주었으니, 이제 그 글은 내 손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나는 내 글을 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된다.
그리고 노래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글에도 주인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몰입해라, 라고 말했던 교수님의 조언에 어느정도는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순간들이 아닐까 싶기도.
이미지 출처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