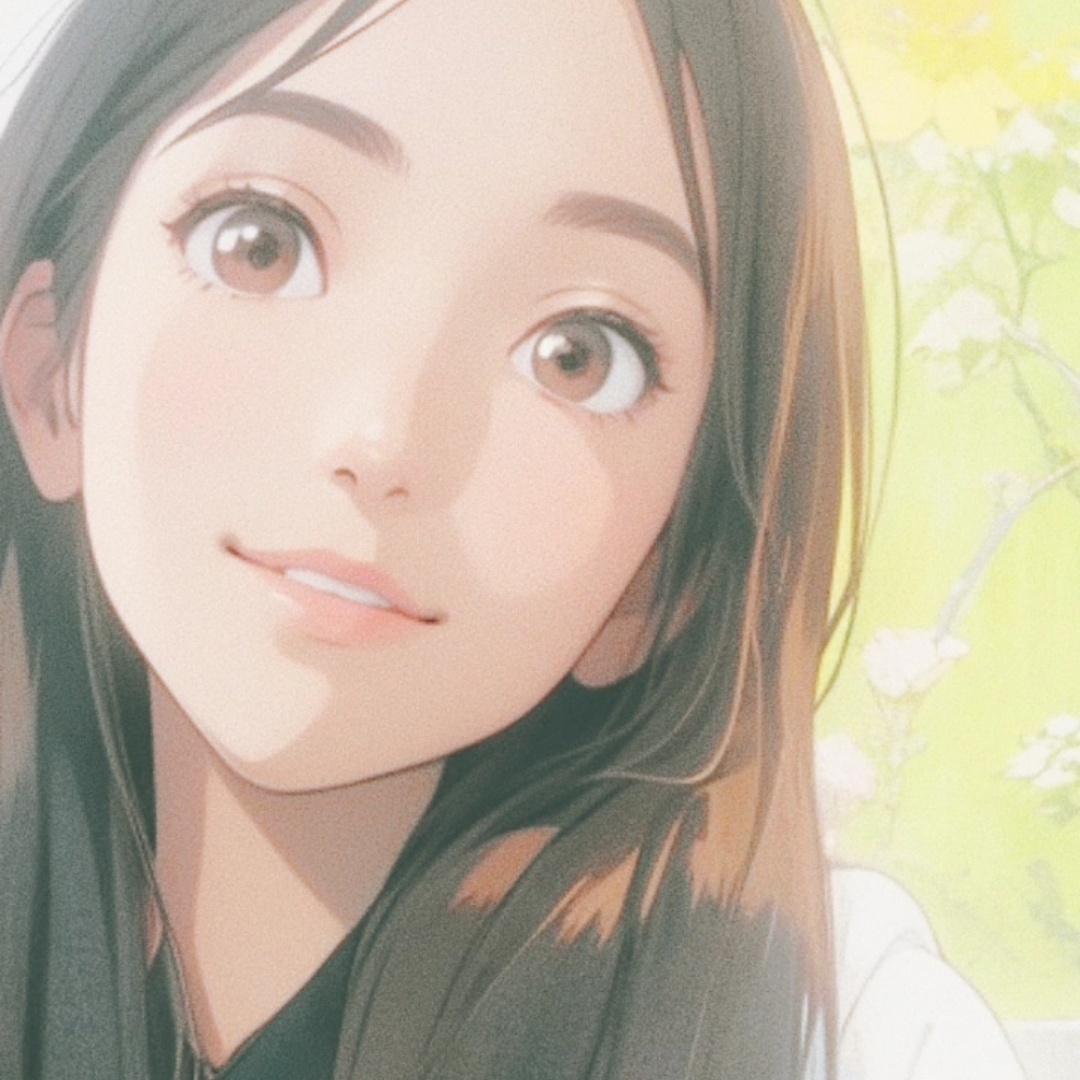사실 이 블로그에서 꼭 써야한다고 생각했던 건 이 글의 복기 때문이었다. 그냥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제대로 된 형태로 쓰고 싶었다.
브런치스토리에서 쓸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불편한 감도 있었다. 거긴 뭔가 사적인 느낌보다는 더... 공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격식을 차려야하는 느낌?
지금 Melon에서 '홍이삭 필청리스트'를 듣고 있다. 지금은 Kiss me Kiss me를 듣고 있다. 이걸 쓰면서는 '나의 너에게'를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노래를 바꿀까하다가 말았다. 노래까지 바꾸고나면 너무 구질구질한 감정으로 남을 것 같아서.
공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2013년의 나는 큰 일을 겪었다. 사실 그 일의 전조는 2012년부터 있었다. 2012년, 내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다는 글을 친구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는 크게 화를 냈다. 나는 그럼에도 모른 척했다. 그러다가 터졌다. 2013년 3월 14일이었다.
두 달 정도 방에 있었던 것 같다. 도서관과 학교만 오가던 것도 이때가 시작이었다. 총학생회도 그만뒀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이때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생각인데, 그때는 공부를 하면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만큼 사람이랑 엮여야 하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공부만 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친구랑 강남역에 사주를 보러 갔었다. 강남역에서 점을 보던 아주머니는 "7년동안 옆에 남자가 있었네, 근데 갔네, 갔어."라고 말했다. 너무 놀라다못해 기겁을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7월에 크게 아플 일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2017년 여름, 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갔다. 생애 첫 유럽여행이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열흘 간 크게 아팠다. 그때 테라플루를 처음 먹었었나? 아무튼 그랬다. 프랑스로 가는 티켓을 결제해둔 상태라, 아픈데도 프랑스로 갔다. 그리고 다녀와서 봤던 풍경을 그냥 품고 있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다. 내가 덕질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교수님은, 나에게 덕질과 관련해서 부모님까지 끌어와서 온갖 소리를 했었다. 홧김에 대학원을 그만뒀다. 도망이었다. 무서웠다. 평생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메일 주소를 없애고, 새 사람이 된 채로 입사했다. 회사에서 나는 제법 유능했다. 부모님 밑에서 일한 게 도움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글 쓰는 것을 멈추지는 못했다. 사설 업체(글ㅇㄱ)에 등록을 해서 글을 썼다. 그러다보니 그게 길어졌다.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위한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그 무렵에 썼던게 <나의 너에게>이다. 6주동안 책쓰기 프로젝트라는 말에 걸맞게 써야해서, 나는 첫주부터 A4 4장씩 총 12장의 글을 썼다. 그리고 남은 두 주 동안은 완성본을 가지고 ㅈㅅㅇ작가님과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할까 하고, 글 속에서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용서를 할 만한 일인가?
사실 그 전에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 우습게도 텝스 시험장에서였다. 둘 다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만 아는 척을 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너도 뭔가 불편한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 말이다.
습한 공기와 따가운 볕에 정수리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일찍이 프랑스의 여름은 들은 적이 있어서 모자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오자마자 모자로 머리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자는 백팩에 걸고 같은 노래만 흘러나오는 이어폰도 뺐다. 낯선 공기와 소리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프랑스의 7월, 그리고 오후는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글로 풀어내는 데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하든 내 마음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 외국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이해가 됐다. 약간 현실이랑 떨어졌다. 원래는 동네에서 마주하는 내용이었는데, 죄다 회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고나니 글의 무게가 조금 줄었다. 성공적이었다.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하나 고민했다. 아무리 작명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나는 이니셜을 쓰기로 했다. G가 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알파벳을 쓰느라고 애를 먹었다. 애꿎은 영어 이름을 두고 이 알파벳은 왜 들어가서 글의 분위기를 못살리게 하냐고 굴던 때도 있었다.
아, 실화냐, 에세이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감정 기반으로 한 100%의 소설입니다. ㅎㅎ
프랑스 배경은 실화인데 계단 밟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냥 피곤했었다고 하네요.
G에 대한 이미지는 남들이 보는 G로 그렸다. 이미 내 안에서는 매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생각보다 겁이 많은, 그리고 어린 사람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기를 뒤져가며 남들이 G를 어떻게 평가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G의 모습과 대립 구도로 두었다. 상념을 돕는 사람으로는 가이드를 골랐다.
나는 제목을 쉽게 정하지 못한다. 쓰는 제목을 보면 죄다 명사로 쓴다. 요즘도 건조하고 창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제목이라고 선생님께 혼나곤 한다. 그러다가 2019년에 나온 신혜성의 <나의 너에게>가 생각났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들어보세요, 노래가 제법 힘이 돼요) 여러가지로 통할 것 같았다.
제목을 정하고 나니, 결말이 쉽게 써졌다. 결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던 터였다. 아무리 해도 연애소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후련한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가 완성된 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리고 네가 나에게 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 숨만 고르고 나면,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G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이다. 그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심이었다고, 너와 있던 시간을 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너와 있던 시간을 들어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를 좋아했다고 말이다.
사실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말. 이상하고 애매하고, 뜨뜨미지근하면서 남들이 오해하기에는 좋으나 서로 절대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글에서라도 하니까 조금 후련해졌다고 해야하나? 이 글을 볼 일이 없을테니 말하는 건데,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며칠 전에 선배가 나보고 "이성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감성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때 선생님이 "감성적이지 않은 건 아닌 듯 하다"라고 말해서, 나의 어디를 보고?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면서 보니 완전 TTTTTTTTT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ENTJ입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세차게 불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익숙한 물 비린내가 나는 바람이 나의 등을 떠밀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곳에서 보인 적 없었을 밝은 표정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시작으로 두 눈을 질끈 감고 양손은 주먹을 쥐었다. 무릎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나는, 내가 이곳에서 밟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이렇게 글이 끝났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다. 단계적으로 밟아갔다. 글을 쓰고, 어느정도 쓸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멋대로 퇴사를 해버렸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다시 학원에 들어갔다. 학원 수업은 회사보다 시간을 넉넉하게 쓰면서도 월급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어서였다.
학원마저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이 글에 대한 후기? 복기?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들여서 윤활까지 해둔 키보드를 굳이 두드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야하나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홍이삭 님이 복기의 이유에 대해서 쓴 걸 보고 결심했다. (이 사람은 여러가지로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덕질하는 것 이상으로)
이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침대에서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핸드폰으로 몇 줄 써보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써도 될까 하고 말이다.
그래도 내가 그때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리고 이랬구나, 써서 무엇이 변했구나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 같아서.
그래서 그냥 썼다.
오늘도 결국 '그냥'으로 끝나버리는 글.
이미지 출처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