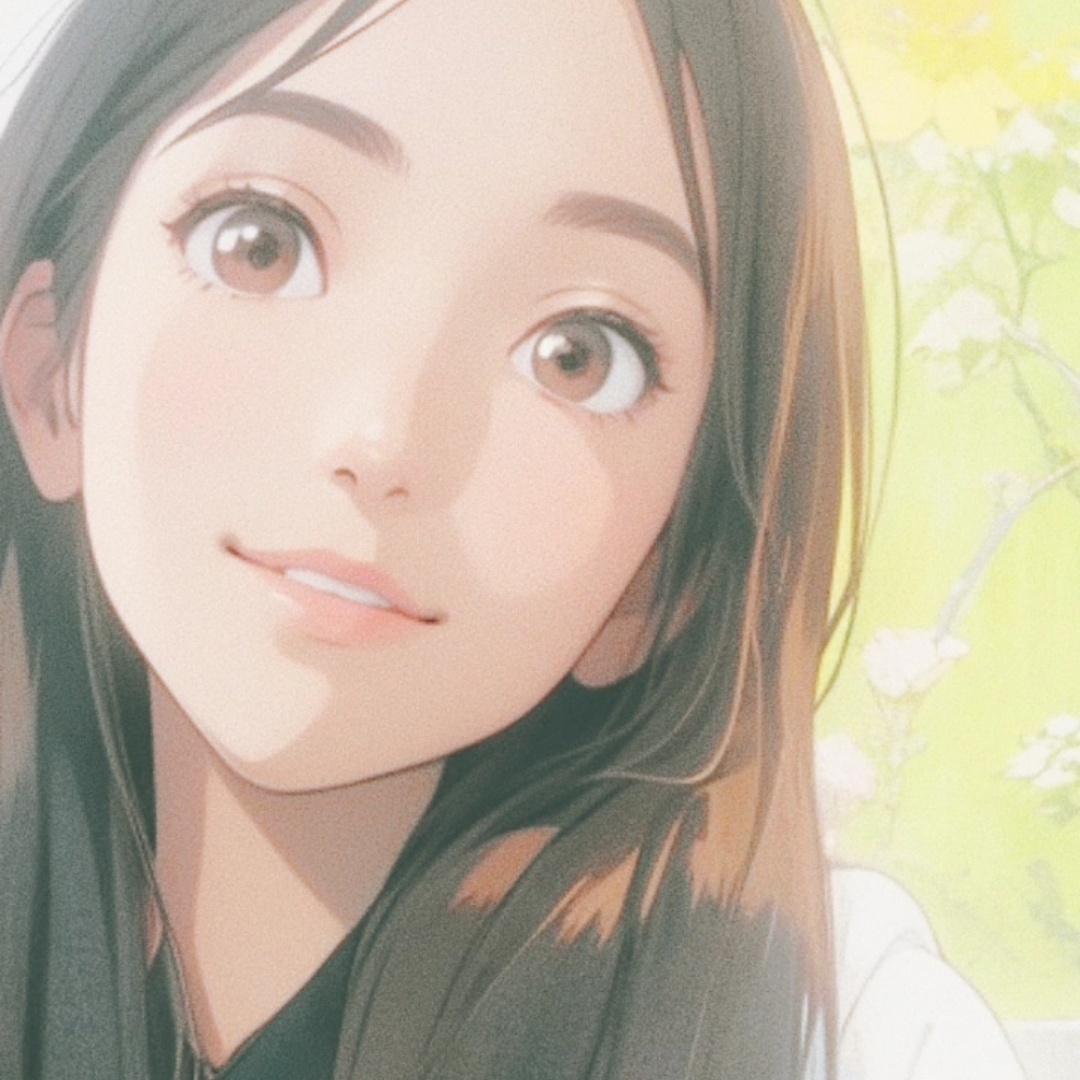브런치 스토리에는 직접적인 덕질 언급을 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상하게 싱어게인3의 58호 가수를 잡고 난 뒤로는 더 그런 생각이 든다. 매사가 쉽지 않다. 브런치에 쓰면서도 몇 번이나 갈아엎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플랫폼이라 나는 거기에 글을 비정기적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왔다.
오늘의 글은 브런치 스토리에서의 글을 조금 빌려올까 한다. 그러면 아마 홍이삭 님이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시작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시간이 좀처럼 안가서 블로그를 손 본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 싱어게인3을 봤다. 10년만에 주어진 휴식은 거의 싱어게인3과 함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가수 '홍이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익숙하다 했더니, 너목보 시즌2의 내 과거의 가수 '신혜성 편'에 나왔었더라. 귀에 익어서인지 노래를 듣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나는 생각보다 노래에 보수적이다. '옛 노래가 좋다'의 보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몇 안 된다는 말이다. 친구들은 이런 나를 두고 "음원계의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난을 치곤 한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듣지 못하다보니 노래방도 혼자 가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쉽게 끼지 못한다. 그렇게 '가수 신혜성'을 좋아한지 20여 년만에, 새로운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듣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자체로도 놀랍다.
그때는 군대간다고 하길래 '어떡해'가 감상의 전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가수 홍이삭 님의 블로그를 알게 되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만 된 정갈한 블로그에는, 싱어게인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복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6R까지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6R 글의 파장이 상당했다.)
며칠 전, 교수님을 뵐 일이 있었다. 무엇을 하면서 지내냐길래, 고민 끝에 솔직하게 답했다. 원래같으면 무엇이라도 성과를 급하게 내서 가져갔었는데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 이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었다. 포장할 기력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교수님은 나에게 "잘 노는 사람이 글도 잘 쓴다"라고만 말씀하실 뿐, 앞으로 무엇을 더 해와라, 어떻게 살았다가 와라, 무엇 정도는 했어야 했다 같은 말씀은 전혀 안 하셨다. 알고보니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재단하고 내 한계를 정하게 하는 것이라 안 하셨다고 한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나는 생각보다 겁이 많다. 당돌하고, 추진력 있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사실 그건 실패가 두려워서 하는 발악에 가깝다. 그 사실을 깨달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상하게 경연자들에게 눈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겁 많은 나를 TV에 노출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나에게 교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다른 일들 - 생계나 여타의 것들 - 은 잠시 내려두고, 글쓰기에 몰입하라는 것이다. 100% 몰입했을 때 내가 어떤지 본다면, 앞으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 경연자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홍이삭 님의 블로그 글이 생각났다.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서 더 익숙했나 싶었다.
몰입에 어떻게 힘써야 천안에서 올라오는 내내 한참을 고민한 것 같다. 그러다가 홍이삭 님의 아이디어를 빌리기로 했다. 그분은 경연마다 후기글을 쓰고 복기했다면, 나는 매 글마다 복기를 하겠다고 말이다.
사실 글을 처음 쓸 때의 의도와 무관하게, 쓰다보면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 공모전에 붙으려면 이런 주제의식이 있어야 하지, 이런 기술을 써야하지, 이런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게 써야 평론가들에게서 좋은 평을 듣겠지 등등. 그러다보면 본질이 점점 사라진다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이 되고,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글은 내 의도와는 확연히 달라 길을 잃은 것이 되어 버린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여기저기 넓은 범위에서 도움을 받아 하나를 써나가는 사람이 박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로 나는 밟아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을 디뎌야 하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생각.
운동화 끈을 새로 매고 있지만, 그래도 한 편으로 운동화는 내 것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